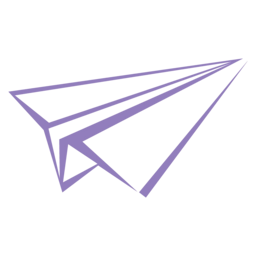트위터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나 배달의 민족과 같은 것들이 일상의 일부분이 되기 한참 전부터 자신이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에 관해 사진을 찍거나 어딘가에 적어 놓거나 하는 사람은 분명 존재했다.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라는 물음에 나는 살기 위해 먹는 편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 그런 난,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도대체 왜 사진을 찍는 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논문을 읽다 보면, 이 논문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여 이름을 검색해보곤 할 때가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개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정작 읽고 소화해야 할 논문은 내팽개치고 웹사이트의 구석구석을 살펴 보는 것에 시간을 쓰곤 한다. 물론 연구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라고 해서 모든 내용들이 연구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먹은 음식에 대한 기록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남겨두는 연구자도 종종 볼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여러 종류의 음식에 대한 기록이 아닌, 아마도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에 굉장한 집착을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베이글‘이나 ‘우동‘을 사 먹었는지 사진과 함께 워드로 정리를 해 놓는다거나, 수년간 먹은 ‘카레‘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연구자도 있었다. 가끔은 ‘왜 이렇게 까지 꼼꼼하게 정리하는 걸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살기 위해 음식을 먹는 나는 외식을 하는 횟수가 적으며, 병적으로 집착하는 음식 또한 없다. 한 가지 연구 주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기 보다는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 ‘관심’만 많은 편이라, 어떻게 이런 성격인 내가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나조차도 의문이다. 이런 나도 음식 한 가지에 집착하는 게 가능할까?
글 제목: 연구자는 먹는 것에 대해서도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가?